October님 ccoli.co/@abcdefg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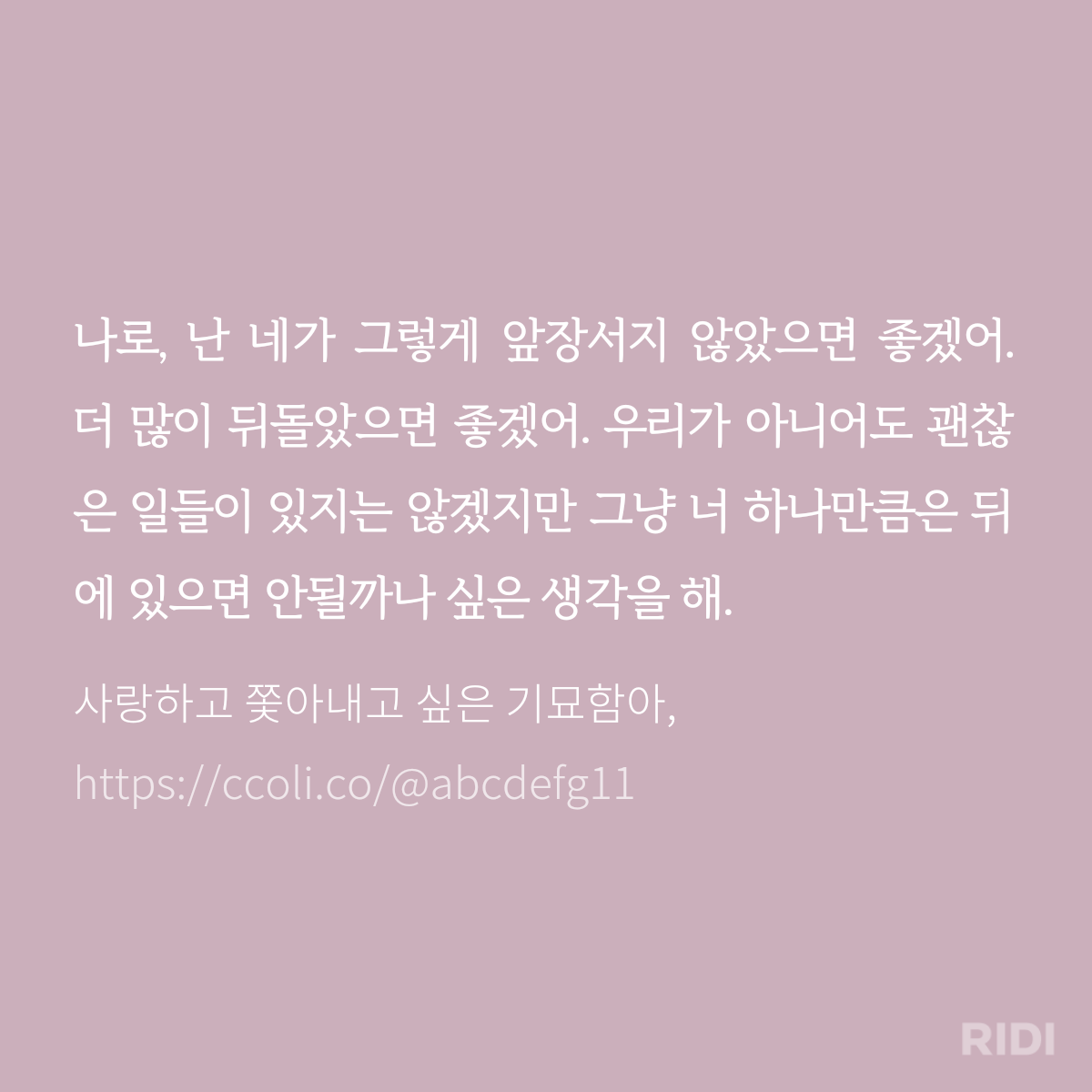
사랑하고 쫓아내고 싶은 기묘함아,
눈이 아릴 정도의 하양을 보면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머나먼 곳에 있다는 한 사막을 떠올렸다. 어떤 사막은 비가 오는 시기면 회갈색 모래 위에 분홍빛 꽃이 흐드러진다 했다. 멀리서 그 둔덕을 보면 마치 분홍빛 사막이 펼쳐친 것처럼 기묘해서 여행자들을 끌어들인다는 말 또한 들었다.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싶은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존재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댔다.
그 기분이 뭔지 알것 같았다. 내가 마법을 볼 때의 감정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꿈에 대해 천 번 이상의 재정렬을 했고 천 번에 가까운 재정렬을 마쳤다. 달지도 쓰지도 않은 과정이었다. 굳이 따지자면 그냥 고되기만 했던 듯했다. 신뢰하는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짜맞추고 짜맞추다가 결국 탈진해 버렸을지도 몰랐다. (내심 백 퍼센트 탈진해 버렸으리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없지 않다.)
다행히도 이제는 뒤로 제쳐둬도 괜찮은 이야기들이었다. 대신,
나로가 눈밭 위를 걸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또 그와 같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려나.
이는 내가 나로를 신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내가 나의 생각과 응시를 수천 번 재정렬하는 것과 좀더 가까운 이야기였다.
뽀득뽀득 눈 위를 걸으며 나보다 앞장서 생기는 나로의 발자국을 본다. 나로의 발은 내 발보다 꽤 작은 편이지만, 발자국이 찍히는 무게감은 나와 별다를 바가 없다. 그는 늘 그랬다. 확신으로 행동하는 사람, 걸어야 할 길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손 뗄 때와 물러날 때를 착각하지 않는 사람. 나의 멋진 동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어서, 저렇게 앞서서 걷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기묘함에서부터 떼어놓고 싶은 사람. 사실은 전부 내 문제인데도.
한 번은 나로에게 이야기하는 상상을 해 봤다. (어쩌면 실제로 이야기했을지도 몰랐다. 조금 우회적으로. 내가 시침 떼느라 나몰라라 했을 뿐.) 나로, 난 네가 그렇게 앞장서지 않았으면 좋겠어. 더 많이 뒤돌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아니어도 괜찮은 일들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냥 너 하나만큼은 뒤에 있으면 안될까나 싶은 생각을 해.
그러나 이는 모두 상상이다. 나는 나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로라는 사람이 좋으니까.
그래서 나는 나로가 눈밭을 앞서 걷게 두고, 그 뒤에서 머나먼 곳에 있다는 분홍빛 사막에 대한 생각을 하며, 아, 이 순간이 지속되지 않으면 좋겠다, 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 충동이 이기는 순간들이 있다. (거짓말이다. 충동이 아니라 욕심이다.)
“있잖아, 나로.”
“음?”
“……가볍게 들어도 되는데.”
나로가 목소리에 다정함을 실었다.
“가끔 그러더라. 뭔데?”
“…….”
뱉어버린 말을 주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그냥 뱉고 다녔던 삶이다. 능청으로 꿰매가면서. 그건 나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나로의 온난한 눈동자를 보면 눈 위로 칼바람이 부는데도 나는 망설이고 만다.
“……내가 발자국을 만들면 그 위를 네가 밟는 거, 이상할 거 같냐?”
나로는, 내 의도를 간파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웃음을 터트렸다. 그 모습이 못마땅해서 나는 꽁하니 나로를 쳐다봤다. 뭐 왜 뭐. 난 그러고 싶단 말이야. 물론 그런 거 너랑 안 어울리고 나도 알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말이지….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나로가 말했다.
“이리 와 봐.”
나는 여전히 왜 뭐 왜, 하고 쳐다보다가 터벅터벅 나로의 옆에 나란히 섰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선, 나란하고 평행한 시선이 만들어졌다.
나로는 그걸 끝까지 보더니, 내가 옆에 서자 이제는 비켜보라 슬쩍 밀어냈다.
뭐야? 하지만 난 나로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움직였다. (표정은 아닐지도 몰랐다.)
그러더니 나로는 내가 옆에 서느라 만든 발자국 위에 자박, 소리를 내며 올라섰다.
나는 그 모습을 빤히, 가만히 내려다 봤다.
“기분이 어때?”
“…….”
나는 한참을 말 없이 서 있다가, 툭 내뱉었다.
“사막에 있는 것 같아. 분홍빛 사막.”
“음?”
“…뭔진 비밀이다.”
그리고 괜히 나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언제나 내가 아는 온도 그대로다. 변하지 않는다. 나는 많은 길과 풍경을 거치며 많이도 변했는데, 나로는 언제나 한결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한켠에서 나로가 기묘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그런 나로가 나와 함께하는 기묘함을 쉽사리 믿을 수 없기도 하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들, 마법 같은 이 모든 순간들은 틀림없는 진실이니까.
사막인지 눈밭인지 모를, 흰빛인지 옅은 분홍빛인지 모를 곳을 마저 걸을 뿐이다.




